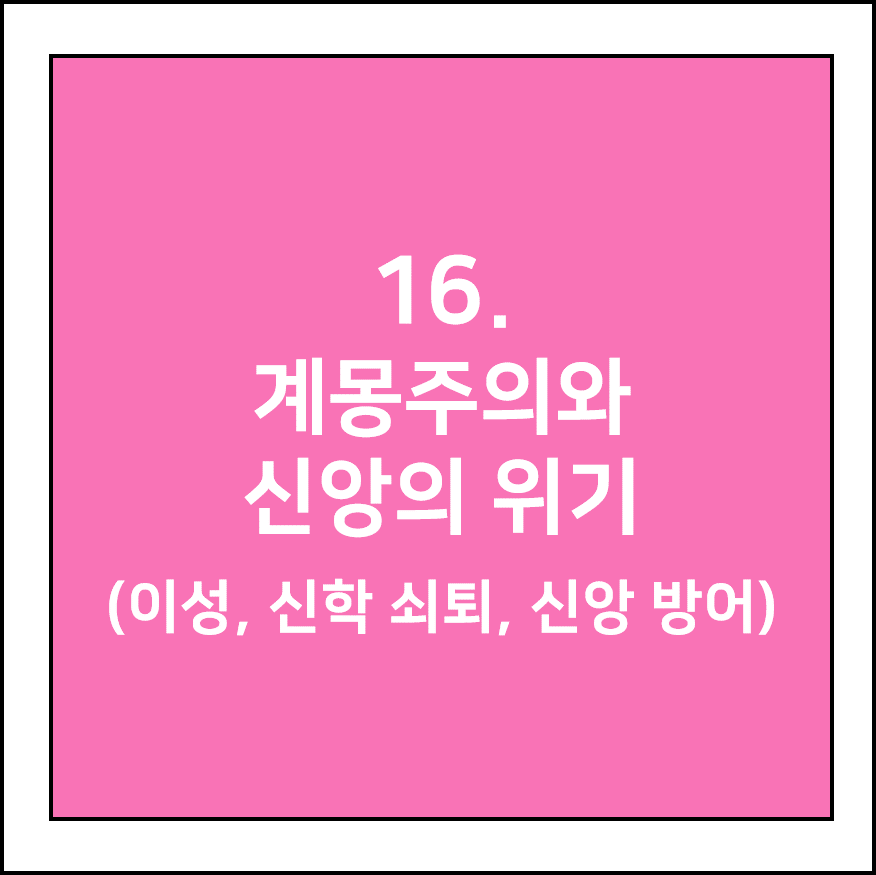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빛의 시대’라 불리는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과학 혁명, 철학적 합리주의, 인문주의의 확산은 전통적인 교회 중심 사회질서와 신앙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의 계시나 교회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성에 기반한 탐구와 비판을 통해 진리를 탐색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신학과 교회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회의, 기적에 대한 부정, 조직신학의 해체 시도는 신앙을 개인적 윤리나 도덕 수준으로 축소시켰고, 계몽주의는 신학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심각하게 흔들어놓았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이 시대를 “신학의 외적 방어보다는 내적 해체가 문제였던 시대”라고 분석하며, 계몽주의가 가져온 도전이 단순한 철학적 위협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 위협임을 강조합니다.
1. 계몽주의의 이성 중심주의와 신학의 해체
계몽주의의 핵심은 인간 이성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이성 중심주의였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선언은 진리의 근거를 외부 계시나 전통이 아닌 자기 인식에서 찾는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볼테르, 흄과 같은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교리를 자연법과 논리적 사고로 해석하거나 부정하며, 신앙의 대상이었던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 교리를 해체해나갔습니다.
특히 바뤼흐 스피노자는 성경을 단지 고대 문헌으로 취급하며, 역사적·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장했고, 이는 현대 성서비평학의 시초가 됩니다. 이로 인해 계시와 기적은 인간 경험의 바깥이 아닌 신화적 언어로 간주되며, 신학은 점차 이성적 체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 권위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고, 신학자들은 신학을 자연종교나 윤리적 종교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이 시기를 가리켜 “이성이라는 새 주인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선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 감성의 틀 속에 갇히고 맙니다.
2. 신학의 쇠퇴와 신앙의 윤리화
계몽주의는 단순히 외부 철학의 도전으로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신학 자체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론, 삼위일체론, 성령론 등 초월적 교리는 이성의 잣대 앞에서 의심받거나 축소되었고, 신학은 체계성과 일관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칸트는 종교를 "실천 이성에 따라 도덕을 완성하는 수단"으로 보았으며, 이는 곧 기독교 신앙이 ‘도덕 종교’로 축소되는 단초가 됩니다.
18세기 독일에서는 ‘계몽주의적 신학(Neologie)’이 등장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윤리적 품성과 도덕적 향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루터와 칼뱅이 강조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 이해를 약화시켰고, 성령의 사역과 내적 변화보다 외적 도덕성과 사회적 유용성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이 시기 신학을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공허한 구조물”로 평가하며, 교회가 더 이상 신학적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윤리 단체로 전락할 위험에 놓였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이후 자유주의 신학의 탄생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됩니다.
3. 신앙방어의 시도와 개혁주의의 대응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정통 신학은 완전히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후기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계몽주의적 사고에 대항하여 신앙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파는 도르트 신조를 통해 인간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계시는 인간의 논리로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청교도적 전통을 이어받은 존 오웬, 토머스 왓슨과 같은 신학자들이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학을 전개하며, 계몽주의적 도전에 맞서 신앙의 본질을 재천명했습니다. 이들은 인간 이성의 자율성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였고, 신학이 철학의 종속물이 되지 않도록 방어적 체계를 세웠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이러한 흐름을 “개혁주의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신학의 출현”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칼 바르트 등은 이러한 흐름을 잇는 신정통주의로 이어지며, 계몽주의 이후의 신학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즉, 계몽주의는 신학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립의 계기도 된 셈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과 자유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빛의 시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동시에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가 무력화된 어둠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단지 철학의 발전기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도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신학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계몽주의는 신학을 시험했지만, 동시에 신학을 단단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이성과 계시, 진리와 의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개혁주의는 바로 그 균형 위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붙드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1) Alister E. McGrath, The Intellectual Origins of the European Reformation
2) Jonathan Israel, Radical Enlightenment
3) James C. Livingston, Modern Christian Thought, Vol. 1
4) John Vidmar, The Catholic Church Through the 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