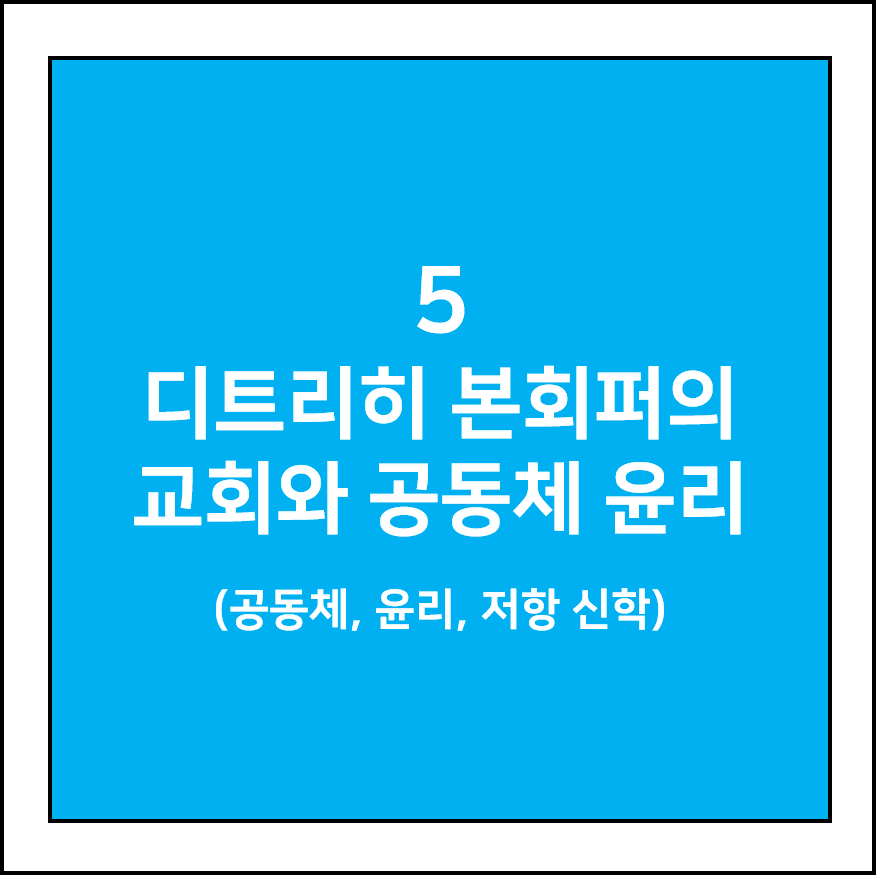
디트리히 본회퍼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신학은 단순한 이론적 탐구를 넘어 고난과 실천,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삶의 현실 속에서 형성된 실존적 사유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신앙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본회퍼는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그 세상의 가치와 대립하며 존재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삶과 신학은 나치 정권의 압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적 실천,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차지해야 할 올바른 위치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회퍼의 공동체 이해와 그의 윤리 신학, 그리고 나치 정권에 맞선 저항 신학을 중심으로 그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체: 성도의 삶과 현실 참여의 장
본회퍼의 공동체 이해는 단순한 인간 관계의 집합체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적 실재의 구현체"로 파악됩니다. 『성도의 공동생활』(Life Together)에서 그는 공동체가 인간의 욕망이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본회퍼에게 공동체는 단순히 신앙의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독교적 증언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는 고백교회 내에서 불법 신학교를 운영하며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이 과정은 단순한 신학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공동체 삶 자체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질서와 훈육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아실현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중심으로 한 삶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체는 신자 개인의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악에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는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윤리: 그리스도 중심의 실존적 결단
본회퍼의 윤리 사상은 단순한 규범 윤리나 목적론적 접근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실 윤리'**를 지향합니다. 그는 『윤리학』(Ethics)에서 도덕적 선악 판단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윤리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이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려는 치열한 신학적 과정입니다.
본회퍼는 윤리를 "순간적 결단의 신학"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미리 정해진 도덕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복잡성과 긴장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따라가는 실존적 과정입니다. 이를 그는 '책임 윤리(Ethic of Responsibility)'라 명명하며, 특히 권력과 불의에 맞설 때는 기존의 윤리 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본회퍼가 히틀러 암살 시도에 가담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는 악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악이며, 진정한 책임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윤리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의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 윤리에 강력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3. 저항 신학: 종교 없는 기독교와 세속 안의 신앙
본회퍼는 감옥에서 집필한 『옥중서신』(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에서 "종교 없는 기독교"라는 파격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제도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온 전통적 종교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틈새의 신(Deus ex machina)으로 만들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만 호출되는 존재로 축소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세상(world come of age)"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인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현존하신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교회는 세속을 회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세속 한복판에서 고난받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서는 공동체로 재정의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공동체와 윤리를 넘어 정치적 저항과 참여로 발전했고, 실제로 그는 나치 체제에 맞서는 교회의 실천을 몸소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없는 기독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둔 것으로, 하나님은 약함과 고난 가운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는 본회퍼의 신학적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단순한 신학 이론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신앙과 실천으로 살아낸 증언자였습니다. 그의 공동체 신학은 교회를 탈정치적 공간이나 영적 도피처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구체적 현장으로 재정립했습니다. 그의 윤리 신학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행위로 윤리를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그의 "종교 없는 기독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의미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본회퍼는 세속을 거부하는 대신 세속 속에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금 본회퍼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의 신학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살아 있는 도전이자 지침입니다.
출처:
1) Dietrich Bonhoeffer, Life Together (Gemeinsames Leben), 1939.
2) Dietrich Bonhoeffer, Ethics, ed. Eberhard Bethge, 1955.
3) Dietrich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1953.
4) John W. de Gruchy, Bonhoeffer and South Africa: Theology in Dialogue, 1984.
5) Clifford J. Green (ed.), Bonhoeffer: A Theology of Sociality, 1999.
6) 로저 올슨 저, 박규태 역,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 IVP,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