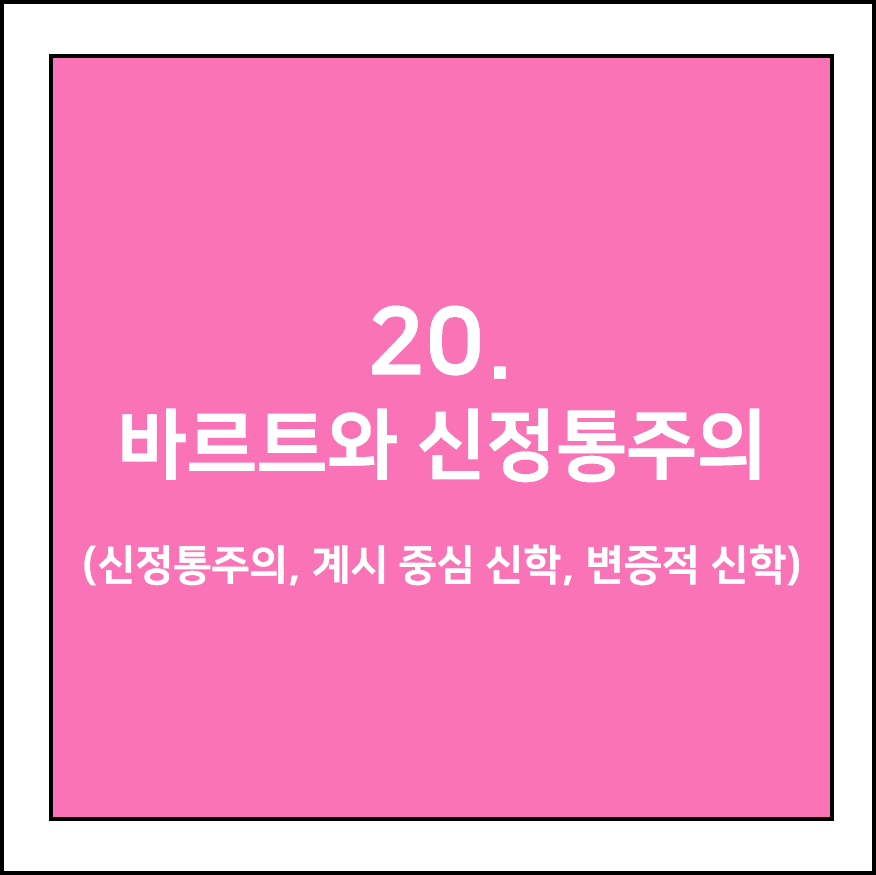
20세기 초는 신학적으로 암흑의 시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19세기 후반의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이성과 경험을 과도하게 신뢰한 나머지, 성경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교훈으로 축소되었고, 복음은 인간 내면의 자각이나 도덕적 진보로 대체되었습니다. 전통적 교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신화’로 여겨졌으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탈신비화의 이름으로 해체되어 갔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치명타를 가한 사건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인간 이성과 문명의 진보에 대한 환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의 윤리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낙관은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등장한 신학이 바로 **신정통주의(Neo-Orthodoxy)**입니다. 이 운동은 과거 정통신학을 무비판적으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권위, 그리고 신의 절대적 주권을 재발견하려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칼 바르트(Karl Barth)**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주석』(1919)을 통해 신학계에 충격을 안겼고, 이후 『교회교의학(Church Dogmatics)』을 통해 20세기 신학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바르트의 신학적 핵심과, 신정통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자유주의에 도전하고 반격하였는지를 세 가지 측면—계시 중심 신학, 변증적 신학의 전환, 바르트 이후 신정통주의의 유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계시 중심 신학: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칼 바르트 신학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확고한 전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사상, 윤리나 역사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간 종교의 기록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인간의 도덕적 경험 또는 세계 역사 속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 주어질 뿐입니다.
바르트는 이 계시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한 증언이고, 교회의 설교는 이 말씀의 선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삼중 구조(말씀-성경-설교)는 바르트 신학의 핵심 구조로, 개신교 신학 전통의 “말씀 중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단순한 문자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말씀되시는 살아 있는 계시임을 강조했습니다.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포와 자기 선언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당시 철학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과 결정적으로 대립되는 구조였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급진적인 계시 중심 패러다임을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바르트의 이 계시론은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전통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점에서도 독창적입니다. 그는 단지 신앙의 옛 언어를 반복하지 않았고, 현대적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를 신학적으로 응답하려는 시도를 통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 움직인다”는 신학을 세우려 했습니다.
2. 변증적 신학의 전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한 이유는 단지 교리의 오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종교적 감정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학의 중심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방향이 하나님을 인간화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르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학이 인간 중심적 설명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설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변증학(apologetics)에 있어서도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변증은 주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며 기독교의 타당성을 논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런 방식이 인간 중심 패러다임에 갇힌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르트의 이러한 사고는 반 틸의 전제주의 변증학과 연결되며, 이후 개혁주의 변증학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르트는 신학이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서 인간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증은 설득이 아니라 신앙의 증언이며, 이 증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르트의 변증적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간극을 인정하며, 이 간극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신학적 구조 안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신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통해, 신학이 철학적 설명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작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바르트의 변증은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정당한 응답임을 드러내는 새로운 형태의 변증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신학의 많은 흐름에 도전이 되었고,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되묻게 하는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바르트 이후의 유산: 정통과 현대성의 대화
칼 바르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단지 방대한 『교회교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통신학과 현대신학을 단절시키지 않고, 성경 중심적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지성적, 사회적 질문과 대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바르트 이후 신정통주의는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그 유산을 계승하거나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예컨대 Eberhard Busch는 바르트의 생애와 편지, 자서전을 통해 그의 신학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시대와의 고통스러운 씨름에서 비롯된 실천적 신앙고백임을 조명합니다. George Hunsinger는 바르트의 신학을 “비판적 실재주의적 변증법”으로 정의하며, 바르트가 단순히 신비적 계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뿌리박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신학화한 것임을 해석합니다.
또한 John Webster는 바르트의 도덕신학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윤리적 존재 간의 관계를 통해 성화와 공동체 윤리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Bruce McCormack은 바르트 신학의 발전 과정과 변증법적 신학의 형성을 세밀히 추적하면서, 바르트의 신학이 가진 내적 일관성과 발전 논리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은 바르트 신학이 단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통과 현대성을 대화시키는 신학적 모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르트 이후의 신학은 그의 계시 중심 신학을 계승하면서도, 성령론, 윤리학, 공공신학, 정치신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었고, 특히 하나님의 주권, 말씀의 우위, 그리고 신앙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한편 바르트를 비판하는 입장도 존재하지만, 그 비판조차도 그의 신학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 바르트와 신정통주의의 등장은 단순한 이론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절망과 허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놓친 하나님의 거룩함, 계시의 능력, 인간의 죄성을 회복하려는 바르트의 작업은, 정통신학의 본질을 현대에 재번역한 신학적 반격이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신학교 강의실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는 교회, 자기중심적 신앙에 갇힌 성도들에게도 깊은 각성과 도전을 줍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그의 유산은 개혁주의 신학의 길 위에서 오늘도 살아 있는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1) Karl Barth, Church Dogmatics
2) Eberhard Busch, Karl Barth: His Life from Letters and Autobiographical Texts
3) T.F. Torrance, Karl Barth: An Introduction to His Early Theology
4) George Hunsinger, How to Read Karl Barth
5) Bruce L. McCormack, Karl Barth's Critically Realistic Dialectical Theology
6) John Webster, Barth’s Moral Theology
7)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8) David F. Ford, The Modern Theologians
9) Gary Dorrien, The Making of American Liberal Theology
10) Alister E. McGrath, Historical Th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