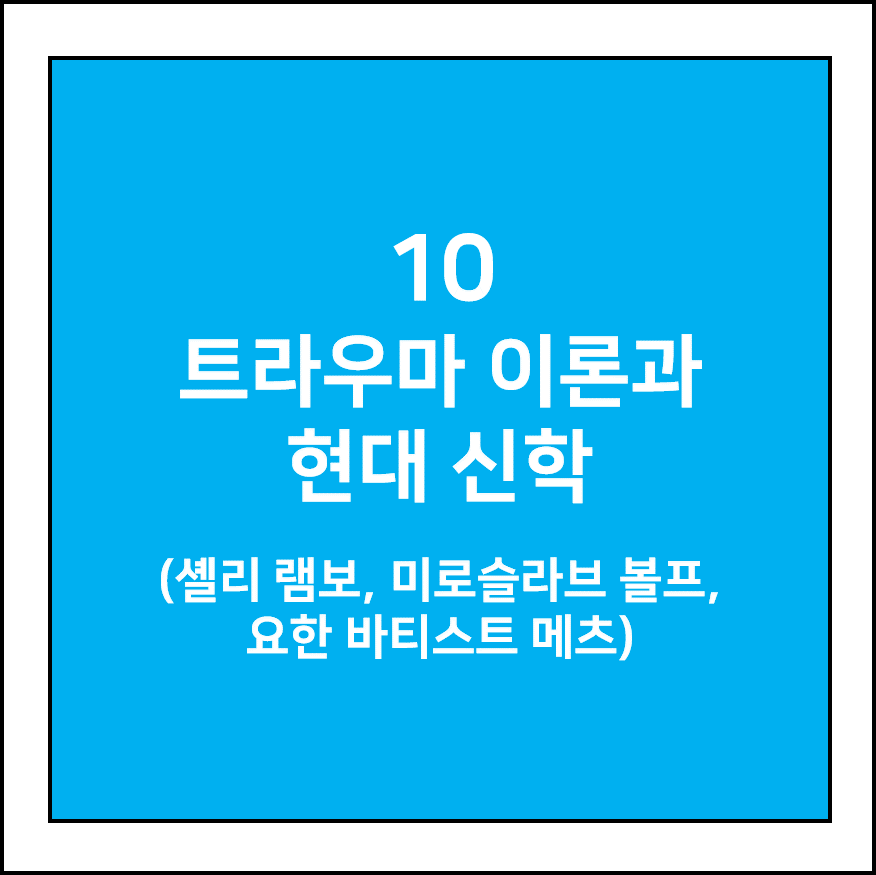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쟁, 학살, 성폭력, 난민 문제, 기후 위기 등 인류가 겪는 고통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신학적 성찰의 방향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깊은 고통과 그 상처의 흔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신학이 이러한 현실에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더 이상 심리학이나 상담학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구원의 의미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트라우마 이론과 현대 신학의 만남입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에 입은 상처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 계속해서 현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경험입니다. 이런 트라우마의 성격은 전통적 신학의 '이성 중심적 구조'나 '회복을 전제로 한 이야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적 감수성과 언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단순히 극복 가능한 일로만 바라보는 신학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지속성, 상처의 잔존, 침묵이 갖는 의미에 대한 신학적 인식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셸리 램보(Shelly Rambo),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요한 바티스트 메츠(Johann B. Metz) 세 신학자를 중심으로 트라우마 이론과 신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기독론적 해석, 기억과 화해의 신학, 정치신학적 연대라는 관점에서 트라우마에 응답하면서, 고통의 흔적을 따라 하나님을 새롭게 이야기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신학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실천적 윤리를 담고 있으며, 현대 교회의 신학적 방향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 셸리 램보: 침묵과 잔존의 신학
트라우마 신학의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는 셸리 램보(Shelly Rambo)의 기독론적 탐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표작인 『Spirit and Trauma: A Theology of Remaining』(2009)에서, 트라우마가 단순히 극복되거나 회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고 스며들며 반복해서 나타나는 고통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램보가 보기에 전통적 기독교의 십자가-부활 서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승리의 이야기 구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고통이 현재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는 제대로 다루지 못해왔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 즉 **성토요일(Holy Saturday)**이라는 중간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잔존하시며 살아계신 고통과 함께 머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빠른 회복이나 즉각적인 치유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간이 중첩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살아갑니다. 램보는 이런 고통의 '남아 있음(remains)' 속에서 성령의 침묵하시는 임재를 제시하며, 하나님이 고통의 깊은 자리에서 함께 거하신다는 새로운 기독론을 모색합니다.
램보 신학의 특징은 기존의 승리 신학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선포하는 희망의 상징이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에게 이런 희망은 때로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부활의 확신으로 건너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램보는 부활 이후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의 시간, 즉 '고통이 잔존하는 시간'을 신학의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전히 손과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계신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고통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지닌 몸의 회복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상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흔적으로서, 예수님이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과 연대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램보의 신학은 오늘날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치유가 회복이나 완결이 아니라, 함께 머무름과 신중한 존재의 동행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장소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2. 미로슬라브 볼프: 기억과 용서의 윤리, 트라우마의 신학적 해석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1990년대 발칸 내전의 참상을 신학적으로 성찰한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는 기억, 용서, 화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폭력의 시대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1996)은 상처와 폭력의 기억을 제거하거나 잊어버리는 방식이 아닌, 그것을 포용(embrace)의 신학으로 전환시킨 대표작입니다.
볼프는 폭력과 배제의 현실 속에서 단순한 화해 이야기가 트라우마를 외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회복이란 고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품고 다시 끌어안는 윤리적 용기라고 주장합니다. 즉,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단절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신앙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프는 하나님의 자기 포기(Self-giving of God) 개념을 통해, 트라우마와 화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폭력의 기억을 넘어서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랑은 고통을 잊게 하거나 덮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서서, 가해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새로운 인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볼프는 단순한 윤리적 처방이 아니라, 삼위일체적 관계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한 윤리적 공동체 형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트라우마의 문제를 신학적 정체성(identity) 문제와 연결지어, 기억이 신자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깊이 성찰합니다. 그는 '기억은 단지 과거의 저장소가 아니라, 현재를 결정짓는 능동적 힘'이라고 보며, 이 기억이 폭력으로 물든 과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는 새로운 공적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볼프는 이 과정에서 '안전한 용서'(safe forgiveness)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무조건 용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진실 말하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즉, 기억의 윤리와 용서의 실천은 진실한 고백과 회복의 맥락 안에서만 가능하며, 교회 공동체는 이 과정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프의 트라우마 신학은 신학이 고통을 억제하거나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회복을 '과거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용기'라고 정의하며, 복음은 바로 이 기억의 품기를 통해 구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프의 신학은 트라우마를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화해의 신학적 계기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3. 요한 바티스트 메츠: 기억의 신학과 정치적 트라우마
요한 바티스트 메츠(Johann Baptist Metz)는 20세기 후반 독일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과 **기억의 신학(theology of remembrance)**을 통해 현대 사회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메츠는 특히 홀로코스트 이후의 유럽 사회, 나치즘의 기억, 그리고 집단적 침묵을 신학의 핵심 과제로 삼으며, 기독교가 고통의 기억을 잊지 않는 윤리적 종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메츠의 신학은 '위로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넘어서는 급진적 요청입니다. 그는 많은 종교적 전통이 고통을 초월이나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무해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고통의 현실과 기억을 신앙 안에서 정면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이를 '위험한 기억(dangerous memory)'이라고 부르며, 이 기억이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고, 기존 질서와 안정된 교리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기억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신학은 단지 체계화된 해석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은 역사적 고통에 응답하는 실천적 기억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메츠에게 있어 트라우마는 단지 심리적 상처가 아니라, 역사적 폭력에 대한 기억의 윤리적 응답입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만들 자격이 없다'고 경고하며,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형성하는 행동하는 기억(active remembrance)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희생자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도덕적 요청으로 살아 있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트라우마의 공공신학적 해석은 메츠의 '고난의 신학'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승리와 영광의 서사로 가득 찬 큰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욥기나 시편의 탄식처럼, 트라우마의 언어 자체를 신학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라우마의 기억을 '타자의 기억'으로 이해하며, 이 기억이 교회의 자기 이해에 도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메츠의 기억 신학은 신학적 정의(justice theology)의 실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신학이 단순히 고통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고 응답하는 책임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메츠의 트라우마 신학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며, 십자가는 단지 구속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의 표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부활 신앙이 고통의 현실을 지우거나 초월하려는 환상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끝까지 기억하면서도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희망의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희망은 고통의 부정이 아닌, 고통의 신학적 수용과 역사적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메츠의 기억 신학은 트라우마에 대해 역사적·정치적 감수성을 동반한 실천적 대응을 요청합니다. 트라우마는 단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역사적 침묵 속에 존재하며, 이 기억을 잃지 않으려는 신학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 정의와 고통의 윤리 앞에 책임 있게 서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메츠의 사상은 포스트홀로코스트 시대에 신학이 어떤 방식으로 폭력 이후의 세계에서 신앙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진지한 응답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이론과 현대 신학의 만남은 단지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책임을 다시 묻는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셸리 램보, 미로슬라브 볼프, 요한 바티스트 메츠와 같은 신학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라우마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신앙과 침묵, 기억과 윤리, 화해와 연대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 신학이 말하지 못했던 '상처 입은 몸'과 '침묵 속의 고통'을 신학의 언어로 끌어올림으로써, 신학을 다시 '현장'으로, '고통의 자리'로 되돌려놓고자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전쟁, 학살, 재난, 성적 폭력, 가정 붕괴,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트라우마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목격자'로서 외면하거나 단순한 설교와 교리로 덮을 수 없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때 트라우마 신학은 교회의 역할이 '말하는 교회' 이전에 '듣는 교회',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고통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억을 지우지 않으며, 신학이 그 기억에 참여함으로써 고통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 안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도전과 동시에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구속사적 관점, 언약의 신학이라는 개혁주의적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의 편에 서시는 분이며, 말씀은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해석하는 능동적 계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라우마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맥락에서도, 성육신적 윤리와 십자가의 고난 신학, 공동체적 회복에 대한 교리적 진지함과 만나야 합니다.
트라우마와 신학의 만남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더 깊게 하며,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신학, 절망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증거하는 신학, 기억을 끌어안고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신학—이러한 신학이야말로 트라우마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제시해야 할 복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출처:
1) Shelly Rambo, Spirit and Trauma: A Theology of Remaining,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2) Shelly Rambo, Resurrecting Wounds: Living in the Afterlife of Trauma, Baylor University Press, 2017.
3) Miroslav Volf, The End of Memory: Remembering Rightly in a Violent World, Eerdmans, 2006.
4)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Abingdon Press, 1996.
5) Johann Baptist Metz, Faith in History and Society: Toward a Practical Fundamental Theology, Seabury Press, 1980.
6) Johann Baptist Metz, A Passion for God: The Mystical-Political Dimension of Christianity, Paulist Press, 1998.
7) Serene Jones, Trauma and Grace: Theology in a Ruptured World,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8) Dori Laub & Shoshana Felman, Testimony: Crises of Witnessing in Literature, Psychoanalysis and History, Routledge, 1992.
9)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10) Richard Kearney, The God Who May Be: A Hermeneutics of Religi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