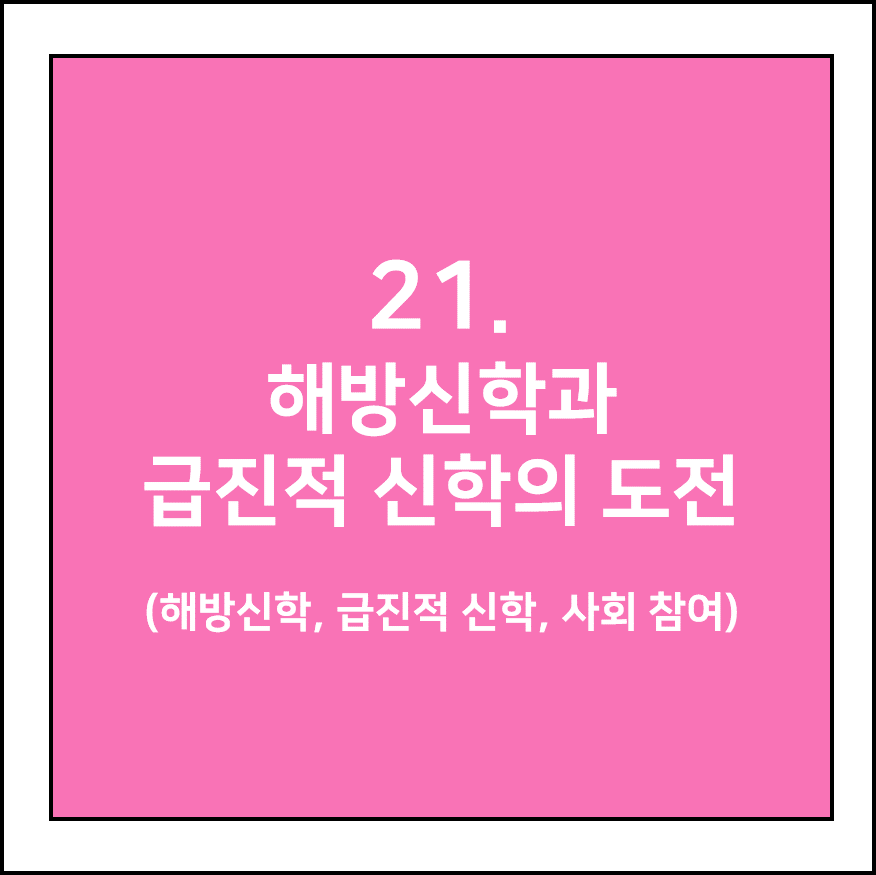
20세기 중후반, 라틴아메리카, 미국 흑인 커뮤니티,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복음이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민중과 분리되어 있다는 깊은 자각이 형성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 구조 비판, 사회적 실천에 뿌리 둔 신학 담론들이 등장하며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이 형성되었습니다. 구티에레스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은 신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했고, 이를 통해 교회는 '하늘나라의 구원'만이 아닌 '이 땅에서의 정의'로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흑인 해방 신학(제임스 H. Cone)은 인종차별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흑인들의 구속자이며, 복음은 그 억압 구조를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 개혁주의 교리—칭의, 성화, 예정론—과 충돌했으며, 복음 중심적 구원이 사회적 해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신학들은 마르크스주의 분석에 의존하면서 계시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주권, 죄의 보편성을 희석한다는 개혁주의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급진적 접근은 구조적 악을 인정하는 반면, '죄'의 본질을 '물질적 억압'으로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해방신학 및 급진신학이 던진 질문들과 개혁주의적 평가를 통해, 사회참여와 복음의 본질의 균형을 모색할 것입니다.
1. 해방신학의 신학적 토대와 민중신학
해방신학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정치적 모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구티에레스(Gustavo Gutiérrez)는 '가난한 자들의 고난'을 복음의 핵심 증거로 보며, 신학은 "하늘나라의 복음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해방"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개념을 통해 교회가 구조적 억압의 최전선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는 이를 단순한 종교적 정체성의 회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방 실천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단순한 구원의 중개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와 불의 구조를 직시하고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보프는 신비주의적 영성과 사회적 실천을 대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영성이 구체적인 해방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학은 가톨릭 교회 안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제임스 H. 콘(James H. Cone)의 흑인 해방 신학에서는 인종차별을 '죄'의 핵심 구조로 인식하고, 흑인의 역사적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선상에서 해석하였습니다.
한편, 아시아와 한국에서 발전한 민중신학은 해방신학과 유사하지만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민중신학은 민중의 삶이 곧 계시의 장이며, 교리는 민중의 고통과 해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恨)의 개념을 통해 억압된 민중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혁주의는 '죄의 보편성'을 간과하고, '사회적 차별'만 강조하며, 신앙의 언약적 구조, 내적 회개, 개인의 구속에 대한 신학적 균형이 상실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2. 급진적 신학의 전개와 구조 비판
급진신학은 해방신학의 연장선에서 보다 급진적 윤리적, 정치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존 소브리노(Jon Sobrino)는 예수를 억압의 현장에서 활동한 역사적 예수로 보며, 교회가 권력에 맞서 '해방의 현장'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후고 아스만(Hugo Assmann)이나 후안 루이스 세군도(Juan Luis Segundo)는 주로 경제적 억압 구조—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비판하려 했습니다.
급진신학의 중심에는 "신학적 해방에는 신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신학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실천론적 접근이 있습니다. 공장, 농장, 빈민촌에서의 집회, 거리 설교 등을 통해 교회는 복음을 구조까지 변혁시키는 힘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희망의 신학(Theology of Hope)은 직접적으로 해방신학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종말론적 희망을 현재의 사회적 변혁과 연결시키며 해방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민중과 함께하심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이러한 급진신학이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하지만 '인간의 타락'을 불충분하게 이해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악과 죄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개인의 회개와 새 창조를 통한 언약적 회복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3. 사회 참여에 대한 해방신학의 입장
개혁주의 신학의 입자에서 해방신학과 급진신학은 부분적으로 긍정적 자극이 됩니다. 사회적 정의와 구조적 죄를 신학적으로 다룬 점은 평가할 만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명확히 옳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죄'의 정의는 반드시 언약적·전인적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속뿐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 신학입니다.
예컨대, 해방신학이 '억압적인 구조'를 비판할 때, 개혁주의는 그 구조를 죄의 현상이자 죄의 결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안에서 성경적 회개와 변화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복음 전도와 철저한 윤리적 실천을 동시에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급진신학의 실천적 행동주의나 정치적 참여는 긍정할 수 있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계시 안에서 시작한다는 전제가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교회는 세상적 정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평화'를 선포해야 하며, 이때 개혁주의는 '신학적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개혁주의 내에서도 사회참여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영역 주권론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했고,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와 같은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의 사회적 관심을 수용하면서도 복음의 초월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해방신학과 급진신학은 분명 기독교가 '죄의 사회적 양상'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며 민중과 함께 울고 웃으라는 매우 중요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회 참여, 약자 사랑, 구조적 죄의 문제 등에서 개혁주의 신학이 더 깊이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개인 구원의 언약적 본질, 성화와 회개의 개인적 과정, 복음의 초월적이며 변혁적인 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 구조의 문제만 강조하는 '편향된 구원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개혁주의적 사회참여는 "구속은 사회에도, 개인에게도, 세상 전체에도" 이뤄진다는 언약적 복음의 전통을 회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구조적 정의에 대한 복음의 영성을 실제 교회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개혁주의는 해방의 사회적 열망과 복음의 초월적 진리를 동시에 품는 균형을 추구하며, 교회가 이 땅에서 증언해야 할 '참 자유'가 어떤 모습인지 해방신학의 도전에 응답하면서도 경계를 잃지 않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출처:
1) Gustavo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2) Leonardo Boff, Introducing Liberation Theology
3) James H. Cone, A Black Theology of Liberation
4) Jürgen Moltmann, Theology of Hope
5) Jurgen Moltmann, Experiences in Theology
6) Hugo Assmann, Practical Theology of Liberation
7) Juan Luis Segundo, The Liberation of Theology
8) Jon Sobrino, Jesus the Liberator
9) Robert McAfee Brown, Liberation Theology: An Introductory Guide
10) Elizabeth Schüssler Fiorenza, In Memory of Her